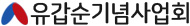"유 지사 일대기, 청소년들에 순국선열 숭고한 뜻 계승 자료"
페이지 정보

본문
|축|간|사|
유갑순 열사는 1895년(제적등본과 공훈록에는 1892년) 10월 22일 경기도 강화군 하도면 덕포리 544번지에서 태어났으며, 독립운동을 하다 붙잡혀 1921년 3월 11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되어 옥고를 치르던 중, 그해 6월 27일 감옥에서 순국한 독립투사로 2018년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유 열사의 유족을 찾지 못하였고, 또한 100여 년 전의 일이라 행적과 더불어 생존기간조차 후대에 만들어진 제적등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다만, 자료로는 종로경찰서에서 3차례 「심문조서」, 경성지방법원에서 일본인 검사와 판사의 3차례 「신문조서」, 「판결문」, 「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 등인데, 이는 모두 일제 관헌의 혹독한 고문 끝에 작성된 것이라는 점을 간과할 수는 없으나 다른 자료가 없는 상황이라 불가피한 면도 있습니다.
이들 자료에 따르면 유갑순 열사는 1895년(명치 28년) 경기도 강화군 하도면 덕포리를 본적과 출생지로, 경성부 누상동 156번지가 주소로 돼 있는데, 이 주소는 유 열사의 처가였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을 하면서 유원규(柳元奎)라는 가명을 썼던 사실도 「신문조서」에 2차례 나타나 있습니다.
유 열사는 19세인 1913년에 향리의 사립보통학교인 개명학교(開明學校)를 졸업한 후 경성학원(京城學院)에서 6개월간 수학하였고, 1916년 12월부터 강원도 평강군 남면 정연리(亭淵里) 소재 합성의숙(合成義塾)에서 1920년 2월까지 교원으로 있다가 독립운동을 하기로 작정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한 후 그해 5월에는 중국 상하이(上海)의 대한민국임시정부 교통국장과 연계하여 경성(서울)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관보」, 대한민국임시정부 기관지 「독립신문」 등을 배포하고 있던 의생(醫生) 이원직(李元稷, 1870~1945, 독립장)을 만나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당시 유 열사는 황해도 사리원(沙里院)에 있는 「독립신문」, 「대한민국임시정부관보」 등을 경성으로 운반하기 위한 비용을 이원직 의사에게 제공하고, 그로부터 이를 받아 이웃의 유진규(柳陳珪) 등에게 배포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해 7월 조선총독부 순사로 들어가서 2개월 동안 경찰관교습소를 거쳐 9월 1일부터 서울 종로경찰서에 근무하면서 동기생 김입중(金立中), 심흥섭(沈興燮), 박창문(朴昌門), 강화도주재소로 부임할 김영석(金永錫) 등에게 군자금을 모아 대한민국임시정부로 가서 장차 독립운동을 할 것에 동의하는 혈서를 받습니다.
이원직 명의로 ‘조선인으로서 꼭 의무금을 내야 한다. 이때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돈이 없는 사람은 노력을 제공해야 한다. 돈을 낼 자격이 있는 사람이면서 돈을 내지 않으면 인간이 아니다. 인면수심이니 꼭 돈을 내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요지의 글을 작성하여 처가에서 하숙하던 경신학교(儆新學校) 1년생 문길(文吉)로 하여금 강원도 평강군 정연리의 갑부 김군욱(金君郁), 합성의숙 숙장(塾長) 황학로(黃學老)의 집으로 가서 독립자금을 모으고, 이 자금 일부는 중국 지린성(吉林省) 군정부(軍政府) 특파원 김준환(金俊煥)에게 만주로 돌아가는 경비 등으로 제공하였습니다.
유 열사는 종로경찰서의 심문, 경성지방법원 검사·판사의 신문에 당당히 말했는데, 이는 미즈노(水野重功) 검사의 신문 내용에 여실히 드러나 있습니다.
“지린성(吉林省) 군정부 특파원 김찬규(金燦奎)에게서 군무총장 노백린(盧伯麟)의 지령서를 받았다는데 어떤가?”
“그렇다.”
“순사까지 지내면서 왜 그런 불온한 짓을 했는가?”
“상하이(上海)로 가서 상당한 임시정부원이 되고 싶었다.”
“김석연(金石然)이라는 자에게서 ‘13도 총감부 특파원’의 사령장을 받았다고 했는데, 돈을 많이 모으면 무엇을 할 생각이었냐?”
“돈이 많이 모이면 임시정부로 보내고, 많이 모이지 않으면 조선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비용에 출당할 생각이었다.”
이원직과 대질신문에서,
“이원직(李元稙)에 대하여 증인은 성명을 어떻게 말했는가?”
“최초에는 유갑순(柳甲順)이라 하면서 인사를 했으나 독립운동을 하게 된 뒤에는 유원규(柳元奎)라고 사용했다.”
유 열사는 1921년 3월 11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정치범죄처벌령(政治犯罪處罰令) 위반 및 공갈죄’로 징역 5년이 선고되자 3월 13일 공소를 포기한 것이 「상소권 포기 신립서」에 나와 있습니다. 유 열사가 공소를 포기한 이유는 드러나지 않았으나 공소를 포기하는 경우는 대개 자신에게 선고된 형량이 만족한 경우, 일제 관헌에 선처를 요구할 의향이 없음을 강하게 표시할 경우, 혹독한 고문에 지쳐 삶을 포기한 경우 등인데, 유 열사가 얼마 후 옥사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세 번째의 경우일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필자는 이 책의 원고를 접하고 나서 두 번 놀랐습니다. 그 하나는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거짓 없이 쓴 글이고, 또 하나는 상황을 섬세하게 표현했다는 점에서 놀랐습니다. 이 책은 유갑순 열사의 행적을 연구하는 학자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100여 년 전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의 숭고한 삶을 이해하는 데 매우 유익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태룡 인천대 인천학연구원 독립운동사연구소장
- 이전글"유 열사 인물전, 강화와 인천을 넘어 대한민국 독립운동사에 거룩한 발자취로" 23.07.20
- 다음글"유갑순 지사 일대기, 자유와 독립 일깨우는 귀중한 사료" 23.07.20